
광명흥신소를 찾다.
한참을 망설였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광명흥신소 문을 두드렸다.

아이의 이상 신호는 생각보다 일찍 시작됐다.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했고, 교복은 잦은 세탁 끝에 이상하게 헤져갔다.
처음엔 단순히 친구와의 다툼 정도로 여겼지만, 점점 말이 줄고,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결정적으로는, 교과서 뒷장에 누군가 쓴 욕설 낙서를 발견했을 때였다.
그 낙서 속에는 아이 이름과 함께 노골적인 조롱이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아이에게 물었다.
대답은 없었다. 다만 울기만 했다.
아무 말도 못 하고 소리 없이 우는 아이를 보며,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직감했다.
학교에 먼저 이야기해볼 수도 있었지만, 증거도 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건 광명흥신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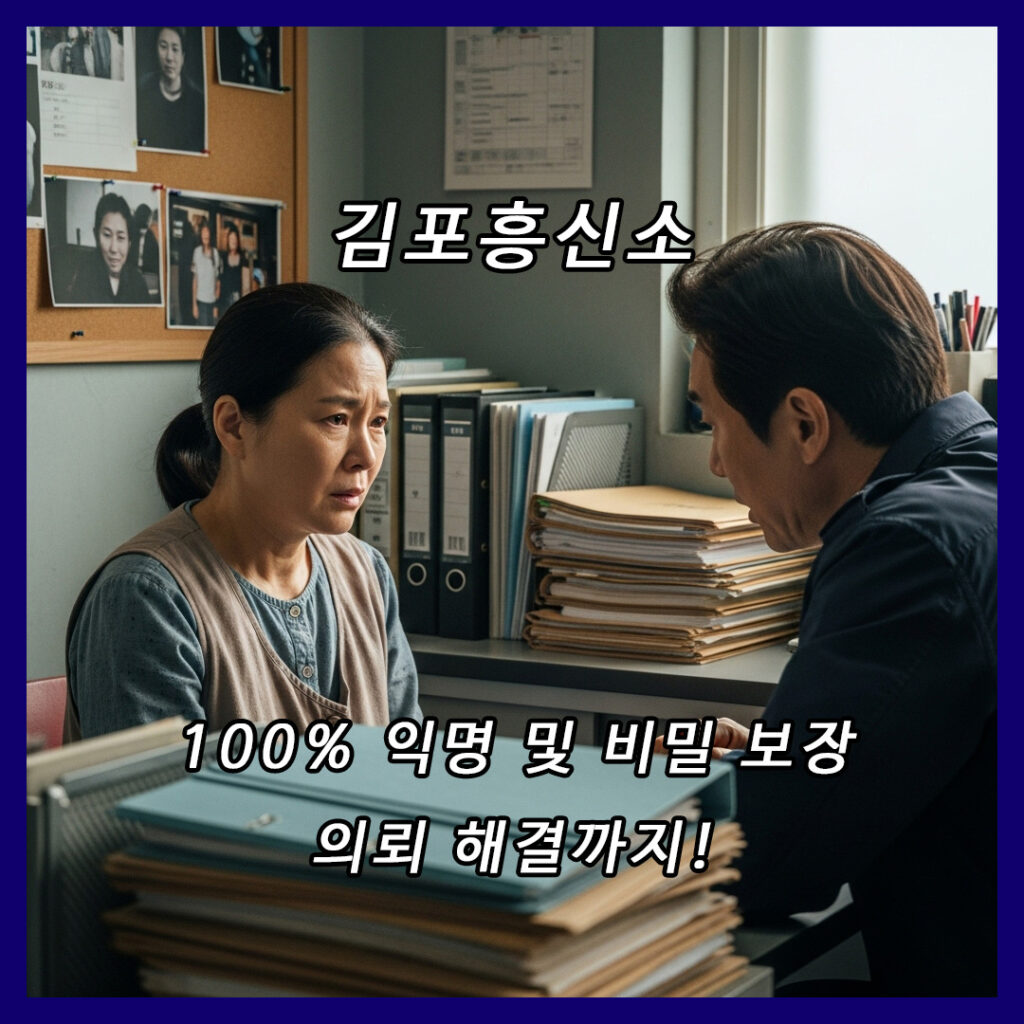
의외였다.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어두운 분위기나 비밀스러운 느낌이 아니었다.
상담실은 밝고 조용했고, 상담사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줬다.
아이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오히려 위로처럼 들렸다.
조사는 아이의 등하교 동선, 쉬는 시간, 복도 CCTV 확인, 주변 학생들의 행동 관찰 등으로 이뤄졌다.
물론 불법적인 요소는 전혀 없이, 정당한 절차와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걸 매일 보고를 받으며 확인할 수 있었다.
광명흥신소의 팀은 학생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접근했고, 아이가 느낄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일주일 후, 자료가 도착했다.
사진, 정황보고서, 영상 일부, 그리고 몇몇 교사의 간접 언급.
우리 아이는 교실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무리에서 고의적으로 배제되고, 사물함이 뒤져지고, 체육시간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다.
심지어 화장실에 몰아넣고 말을 시키지 못하게 했다는 녹취 일부까지 있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건, 죄책감이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건 아닐까.
그동안 아이가 보내던 신호를 다 놓쳐버린 건 아닐까.

자료를 들고 학교를 찾아갔다.
처음엔 교사도 당황했다. 하지만 보고서와 증거자료를 보여주자 태도가 바뀌었다.
광명흥신소 측에서 정리해준 문서 덕분에 대응 절차가 빨라졌고, 학교폭력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열렸다.
가해 학생들은 분리 조치됐고, 우리 아이는 담임과 학교 측의 집중 보호 대상이 됐다.
아이는 조금씩 회복 중이다.
다시 아침에 눈을 뜨고, 스스로 교복을 챙기고, 친구 한 명과 웃는 모습도 보였다.
그 모습만으로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광명흥신소를 찾았던 그날이 자꾸 떠오른다.
망설이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건 ‘확신’이었다.
아이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절박함,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현실.
그 모든 걸 내가 혼자서 할 수 없었기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어쩌면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른다.
“학교 문제는 학교에서 해결해야지, 흥신소는 너무 과한 거 아니냐고.”
하지만 나는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아이가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본 적 없는 사람이라는 걸.

광명흥신소는 단지 조사를 대신해주는 곳이 아니었다.
내가 부모로서 무력하지 않게 만들어준, 현실적인 조력자였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이 글을 남긴다.
혹시 당신의 아이도,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징후를 마주한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